
망경사로 오르는 길가의 자작나무.
겨울 산은 명징하다. 모든 것이 또렷하다. 나무들은, 세상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허공에 조각한다. 언제라도 바람은 길을 잃는 법이 없지만, 겨울 산을 지나는 바람은 한순간일지라도 머뭇거리는 법이 없다. 물은 낭랑히 흐르거나 아니면 침묵한다. 바위의 과묵은 대지 속으로 더 깊숙이 뿌리내린다.
겨울 산에서는 인간의 오관도 밝아진다. 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음에 새긴다. 피돌기, 맥박, 호흡, 근육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거울에 비치듯 선명해진다. 겨울 산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주지 않지만 적어도 ‘살아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분명히 알게 한다. 사는 일이 심드렁해지면 겨울 산을 찾을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능적으로,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겨울 산을 찾는지도 모르겠다.
태백산은 늘 겨울에 오르게 된다.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었지만 두 번의 백두대간 종주 때도 태백산은 겨울이었다. 10여 년 전 겨울, 천제단에서 망경사로 내려서는 길가의 눈밭에서 눈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진 기억은 아직도 냉동 상태로 보관돼 있다. 2인용 텐트에서 4명이 궤짝에 든 동태처럼 머리와 발을 엇갈려 한 밤을 보냈었다. 침낭이 한 겹 더 입은 옷이었다면 서로의 체온은 북극곰의 털이었다. 흐린 아침이 왔을 때, 천제단에서 내려가던 한 스님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는 따스했다. 이렇듯 남이 내 삶을 살아주고 내가 남의 삶을 사는 일이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위) 천제단의 일몰. 빛과 함께 사람도 대지로 스며드는 시간의 평화로움. (아래) 사방의 모든 산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받드는 천제단.
우리말로 ‘한?뫼’, 곧 ‘크게 밝은 산’
우연한 걸음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태백산은 겨울이 제격이다. 눈꽃 때문은 아니다. 눈꽃이야 높은 산이면 어디든 열린다. 태백산은 겨울에 더 밝아지기 때문이다.
태백산은 우리말로 ‘한?뫼’다. ‘크게 밝은 산’이라는 뜻이겠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삼국유사> 속에 등장하는 ‘태백산’으로 역사여행을 떠나야 한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제석(帝釋)을 이름)의 여러 아들 중 환웅이 있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지금의 묘향산) 꼭대기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그는 풍백·우사·운사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삼국유사> 기이편에 나오는 고조선 건국신화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태백산 천제단에서 천제를 지내고 태백산을 영산으로 받드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은 태백산 옆에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삼국유사>가 편찬된 13세기 후반 고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여 ‘백두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단군신화의 태백산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태백산이 오늘날 천신이 강림한 성소로 받들어지고 천제를 지내며 하늘과 소통하는 곳이 된 것일까?
태백산의 천제단을 복원하고 현재 행해지는 천제의 형식을 갖추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김강산(태백문화원 전 사무국장, 현 고문)씨는 다음과 같은 해석으로 태백산이 상징하는 의미의 기둥을 세운다. 고조선이 망한 후 고조선계 주민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이주해옴에 따라 마한·변한·진한으로 이른바 삼한시대가 열리면서 삼한 영토의 꼭지점이 되는 태백산으로 단군신화의 상징성이 옮겨왔다는 것이다. 김강산씨의 견해에는 신앙적·민족주의적 색채가 짙다. 하지만 그러한 견해를 신념화하여 천제단과 천제를 복원했고 태백산을 찾는 일반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또한 김강산씨의 견해는 옛 문헌의 기록과 그 맥이 닿는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일성이사금(逸聖尼師今) 5년(138) 겨울 10월에 (왕이) 북방으로 순행하여 친히 태백산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같은 책에 “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3년(300) 3월에 (왕이) 우두주(牛頭州, 지금의 춘천·철원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영서지방)에 이르러 태백산을 향해 망제를 지내자 낙랑과 대방 두 나라가 귀순 복종했다”고 적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誌)>에도 천제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태백산은 삼척도호부의 서남쪽에 있는데, 신라 때 오악 가운데 북악이라 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신사(神祠)가 있는데 이름하여 태백천왕당이라 한다. 여러 고을 백성들이 봄·가을로 천제를 올린다.”
이외에도 <허백당집>이나 <척주지> 등에 천제를 지낼 때 살아 있는 소를 바쳤다는 흥미로운 기록과 함께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제단 아래에 바쳐진 소가 가득하고 산아래 사람들이 잡아먹어도 탈이 없었다고 한다. 이 소를 퇴우(退牛)라고 하는데, 관청에서 천제를 지낸 뒤 3일 후에 소를 관청에 끌어다 바치게 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민폐가 심해지자 천제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후에도 관청의 눈길을 피해 천제를 지내는 일은 구한말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것도 천제를 중단시킨 원인이었겠지만, 주자학이 조선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중국의 제후국인 조선으로서는 천제를 지낼 수 없게 된 나라의 형편도 작용했을 것이다.
특정 종교를 초월한 태백산 천제

이렇게 본다면 태백산의 천제는 멀게는 삼한시대부터 구한말까지 이어진 셈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복원된 천제단의 내력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은 김강산씨로부터 들은 얘기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구한말에 나철(1863~1916)이 단군을 교조로 한 대종교를 창시하면서 천제단을 보수하였다. 이어서 1942년(단기 4275) 겨울 태백산 남쪽 기슭 천평마을의 주민 윤상명(尹尙明) 등 50여 명이 천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대한독립기원제(大韓獨立祈願祭)를 올렸다. 그러나 그들은 밀고자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獄苦)를 치르는 수난을 겪었다. 그 뒤 한국전쟁 후 무장공비(武裝共匪)가 출몰하자 1955년에 국군(國軍)이 천제단 앞에 헬기장을 닦으면서 천제단을 무너뜨렸다. 10여 년 뒤 봉화군(奉化郡) 물야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던 우성조씨가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천제단을 복원하였다. 이후 1991년에 태백향토사연구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국가지정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제228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 태백시에서 제단을 보수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
오늘날의 천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우성조를 주축으로 경북 봉화 사람들이 지내오다가 종교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1990년 10월 3일부터 태백산천제위원회에서 특정 종교를 초월한 천제를 행하고 있다.
딱딱한 얘기가 길어졌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까닭은 단군신화와 직접 관계없는 태백산이 왜 하늘과 소통하는 상징이 되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기층신앙이라 할 무(巫)의 본향으로서 태백산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태백산 산당(굿당) 가운데 가장 연원이 깊다는 윤씨 산당에서 한 무당을 만났다. 태백산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모든 무당들의 본향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 태백산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무당 행세를 못 한다는 것이다. 삼산밟기, 즉 지리산·계룡산·태백산을 돌며 기도를 할 때도 태백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수적으로 보면 계룡산이 우세하지 않은가. 이에 대한 의문 앞에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온다. “귀신은 앉아 천리, 서서 만리입니다. 신을 모시는 내림굿은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격(巫覡)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은 김강산씨로부터도 들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려주었다. 조선 말에 만들어진 굿 의례집인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면 12거리의 굿 과정 중 첫 번째가 감응굿인데, 흰 한지를 들고 ‘태백산’을 바라보며 ‘성령감응’을 세 번 외치는 것이 굿 시작의 요체라는 것이다. 무의 세계에서도 태백산은 최고 권위의 상징이다. 단군신화에서 시작되는 상징성의 후광 효과인지도 모르겠다. 태백산은 모든 산의 으뜸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

(위) 천제단에서 본 문수봉. (아래) 도무지 감당이 안되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굿당. 아직도 한국인의 심층에는 무(巫)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산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의 아름다움
태백산은 둘레가 천리로 일컬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태백산과 한참 먼 삼척 영은사, 영주 부석사, 영월 보덕사도 일주문 편액에 ‘태백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 함백산 아래의 정암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태백산(1,567m)과 함백산(1,573m)은 둘 다 ‘한?뫼’로 그 이름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어떤 산이 태백산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현대적 산행기의 전범을 보인 고 김장호 선생은 “문헌상으로 태백산은 오래 정암사와 함께 논의되어 왔으니 성급한 대로 잘라 말하면, 본디의 태백산은 지금의 함백산이고, 지금 태백산은 오히려 원 태백산이 길게 남북으로 흐르는 이 산 남쪽 봉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태백산과 함백산이 사실상 같은 이름인 것으로 미루어보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난감한 것은 대동여지도에도 태백산은 현 위치대로이고 함백산의 자리에는 대박산(大朴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는 옛 문헌이나 높이를 떠나 어떤 산이 ‘한?뫼’와 ‘개천(開天)’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천제단 앞에 서본 사람이면 알 것이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하지도 않고, 기암절벽도 없는 흙산이지만 사방에서 거칠 데 없이 다가드는 산들을 품에 안고 하늘을 받드는 품이 한없이 넓고 밝다는 것을. 전혀 높이를 의식하지 않는 그 풍모는 비교나 대립을 다 놓아버린 절대 자유 경지의 표상이다. 태백산은 하늘로 통하는 길이다.
최근에 나온 <무교―권력에 밀린 한국인의 근본 신앙>이라는 책을 보니 재미있는 대목이 있다. 구한말에 선교사로 활동했던 길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대해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유교나 불교적으로 살지만 문제가 생기면 무당에게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요즘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무당들이 천시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격(巫覡)도 어엿한 종교의 사제라는 주장을 펼칠 생각은 없다. 다만 나는 산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세계 그 어떤 고등종교의 신앙보다도 진보적이고 아름답다는 점을, 적어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만이라도 이런 믿음을 더 고양시키자고 말하고 싶다.
어둑해진 당골로 내려서는 길에 눈 밟는 소리가 눈을 밝혀준다. 몸도 마음도 다 가볍다. 산에서는 배낭과 육신의 무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등에 올라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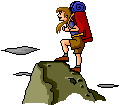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등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하철 첫 차 일출산행] 서울 강남권, 관악산&청계산 (1) | 2022.12.30 |
|---|---|
| [지하철 첫 차 일출산행] 서울 강북권, 북한산 인왕산 안산 아차산 (0) | 2022.12.30 |
| 차갑게 다가오는 저승사자, 저체온증 (0) | 2022.12.28 |
| 가야산, 깨달음으로 피어난 가야의 바위 연꽃 (1) | 2022.12.27 |
| [막막할 땐 산] “이 선생 글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1) | 2022.12.26 |




